500년 후의 질문: 우리의 후손에 말씀이 살아 있는가?
토론토의 초겨울, 해가 서둘러 퇴근하던 토요일 저녁이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김칫국 냄새가 허기와 함께 달려왔다. 여느 때처럼 식탁 위에는 가족용 큰 성경책과 낡은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다. 공책 겉장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다.
“오늘의 D6(경청) 포인트와 작은 순종.”
아이들이 먼저 자리에 앉았다. 막내는 젓가락을 장난감처럼 흔들었고, 큰아이는 휴대폰 화면을 뒤로 돌려놓았다. 아내가 촛불을 켜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읽을게.”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한 대목을 펼쳤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 아이가 묻는다. “엄마, 그게 왜 복이야? 그냥 지지 않는 게 복이지.”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순간 대답이 막혔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공책을 펼쳤다.
“오늘의 질문: ‘우리 집에서 화평을 세우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이 식탁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질문들—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연습장이었다. 그리고 불쑥, 오래 묵은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500년 후에도,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있을까?”
역사는 늘 박물관 진열장 속의 유물처럼 보존되지만, 삶은 밥 냄새와 말 한마디처럼 쉽게 날아간다. 역사는 이름을 남기려 하고, 삶은 관계를 남기려 한다. 성경은 어쩌면 그 둘 사이의 다리를 놓는 책일지도 모른다. 기록으로 남았지만, 꼭 살아 움직여야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가?”라는 물음은 곧 “살아내는가?”라는 물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다리를 식탁 위에서 놓아 보려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를 한 벌 만들었고 이름을 붙였다. “Table Talk(D6 Splink).” 카드는 화려하지 않았다. 한쪽엔 짧게 읽을 말씀, 다른 쪽엔 세 개의 질문과 놀이. “오늘 우리 집에서 화평을 깬 말/표정은 무엇이었을까?” “내일 아침 화평을 세우는 한마디는?” 그런데 질문은 ‘시험’이 아니라 ‘초대’였다. 답을 맞히라는 부름이 아니라, 서로를 걸어가게 하는 초대였던 것이다. 어느 주일 아침, 큰아이가 먼저 말했다. “아빠, 어제 내가 말이 좀 심했지요? 오늘은 먼저 인사할게요. 그리고 네 덕분에 고마워,라고 말할래요.” 그 순간, 말씀은 단지 읽은 문장이 아니라, 식탁에서 삶을 얻은 대화가 되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를 잇는 ‘리듬’의 왕복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우리는 로비에서 서로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도넛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서로의 얼굴을 찔러 보듯 인사를 나눴다. 어떤 날은 설교가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에 미리 만난 본문이 있었기에, 주일의 설교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재방문’이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를 오고가는 강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집에서 흘러나온 작은 고백이 주일에 합류했고, 주일의 은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간을 적셨다. 우리는 그 관계의 왕복을 ‘리듬’이라 불렀다.
‘리듬’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쉬운 단어였다. 신명기의 “앉을 때, 길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가 우리 집에선 이렇게 해석된 것이다. 식탁, 자동차, 잠자리, 아침 인사. 네 개의 자리와 시간이 질문 하나, 기도 한 줄, 작은 행동 하나를 품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리듬이다. 정답은 잊히지만 리듬은 남는다. 숨 쉬듯 낭독하고, 습관처럼 질문하고, 작게라도 움직이고, 짧게 기록하는 리듬. 그 리듬이 5년을 지나고, 50년을 지나고, 한 세기를 돌면, 어느덧 한 민족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500년 후의 질문은 사실 오늘의 습관을 묻는 질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것은 ‘기록’이었다. 아이들이 그날의 작은 순종을 각자 쓰고, 마지막 줄에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적는 것. “오빠, 시험 잘 보길. 화내지 않기.” “엄마, 피곤한데도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기록은 다음 날의 우리를 불러냈다. 어제의 한 줄이 오늘을 살짝 밀어 주는 것이다. 살아 있는 말씀은, 기록 속에서 ‘다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그 공책은 사실 할머니의 공책에서 시작되었다. 이민을 오기 전, 어머니의 서랍에는 소풍 도시락 냄새가 배어 있는 듯한 노란 공책이 있었다. “오늘의 말씀—감사는 입술을 넘어 두 손으로 간다.” “오늘의 실천—김 씨 아주머니 병문안 가기.” 믿음은 사전에서 찾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다는 사실을, 나는 어머니의 동사들에서 배웠다. 김 씨 아주머니의 문을 두드리던 오후, 부엌에서 끓던 미역국 냄새, 따끈한 수건을 접던 손. 신학책을 읽기 전에 이미 나는 삶의 장에서 신학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공책은 두 언어로 쓰였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가끔은 방언처럼 흐르는 눈물의 언어. 이민자의 집에서 언어는 단지 소통 도구가 아니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간직한 그릇이었던 것이다. 토요일 밤 가족예배에서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한국말로 한 번 기도해 볼까?” 그날, ‘아버지’와 ‘Father’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말씀이 언어의 벽을 넘어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유산’이 꼭 재산 목록으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살아 있는 삶, 살아 있는 질문, 살아 있는 기록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확실한 유산인 것이다.
그래서 가끔 상상한다.
500년 후, 어딘가의 후손이 우리 집의 공책을 발견한다고. 페이지마다 어린 글씨체로 “오늘의 작은 순종”이 적혀 있는 것이다. 믿음의 자라는 소리는 높지 않다. 찻잔이 맞부딪치는 작은 소리, 문을 살살 닫는 소리,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작은 목소리. 그런 소리들이 모여 세기를 관통하는 노래가 되고, 기록이 되는 것이다. 500년 후에도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있는가?”—그때의 대답은 아마 오늘 밤 식탁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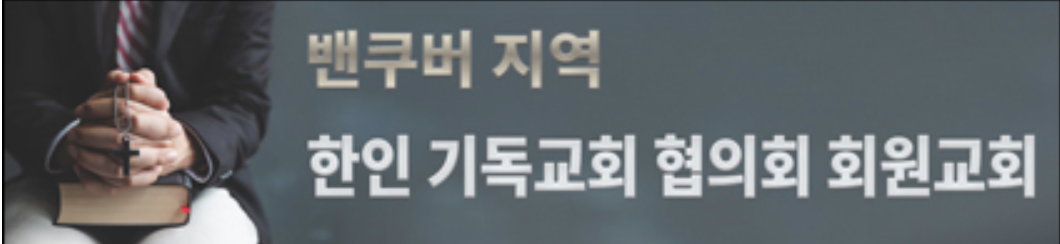

![[칼럼: 하나님의 교육명령] 컨텐츠 혁명7(마지막회) – 왜 D6 커리큘럼인가? 1](https://i0.wp.com/christiantimes.ca/wp-content/uploads/d6.jpg?resize=324%2C160&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