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년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7)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룻 2:20)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여기서 ‘기업 무를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고엘’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기업 무를 자’는 가까운 친족 곧 근족(近族)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와 그에 대한 설명이 희년 본문인 레위기 25장에 나온다.
레 25:23-25, “23.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하나님은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헌장을 반포하시고, 이어서 그 대헌장에 근거해서,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형제를 위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그 땅을 무르라고 명하셨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무를 자’가 대신 땅값을 치르고 땅을 되사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돌려주면, 그 가난한 형제의 입장에서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땅을 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무를 자가 땅을 무르는 것은 가난한 형제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룻 3:6-7, “6.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그의 신발을 벗기고) 거기 누웠더라.”
7절에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밧테갈 마륵겔로타이브’는 ‘그리고 그의 신발을 벗겼다’라는 뜻이다(고세진, “룻의 누명(陋名)을 벗기다: 룻기 3장의 새로운 번역과 “문화언어적” 석의”, 신학과 선교 제7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년 12월), 19-27). 그럼 룻은 왜 보아스의 신발을 벗겼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룻기 4장에 나온다.
룻 4: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발을 벗는 것은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신발을 벗긴 것은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는 일을 확정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의 배경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시(媤)형제결혼법’이다. 남편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시댁의 남편 형제와 결혼하고, 그들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다(신 25:5-6).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문의 장로들 앞에서 죽은 자의 아내에 의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자기 발에서 신 벗김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신 벗김 받은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신 25:7-10).
즉 룻은 보아스의 신발을 벗겨놓음으로써, 보아스에게 “신 벗김 받은 자”(신 25:10), 곧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신 25:9)가 되지 말고, 자신과 결혼해서 보아스에게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 달라고 거룩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고세진, 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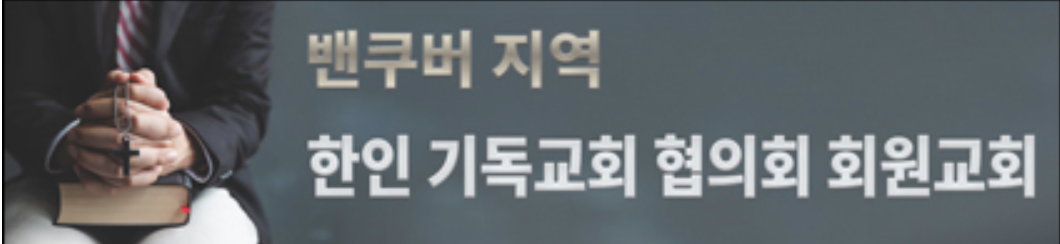
![[칼럼: 희년 이야기] 요셉의 토지 개혁(2) spiral green plants](https://i0.wp.com/christiantimes.ca/wp-content/uploads/pexels-photo-1650921-1.jpeg?resize=324%2C160&ssl=1)
![[칼럼: 희년 이야기] 희년 교회와 코이노니아(2) people standing on dock during sunrise](https://i0.wp.com/christiantimes.ca/wp-content/uploads/family-pier-man-woman-39691-1.jpeg?resize=324%2C160&ssl=1)